요즘의 IT 기술 트렌드는 어찌 보면 새로운 기술보다도 기술이 바꾸는 세상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O2O'다.
O2O는 'Online to Offline'을 일컫는다. 온라인의 채널을 이용해 오프라인 서비스로 연결짓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Offline to Online'으로 통하기도 한다.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널의 확장이라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짓지 않고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을 넓혀주는 것, 그래서 ‘옴니 채널(Omni Channel)이라는 말로 더 잘 통한다.

O2O의 개념 자체는 전혀 새롭지 않다. 우리는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이다. 백화점 대신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하고, 결제하고, 택배로 실제 현물을 받아보는 것 자체가 O2O다. 그래서 이 O2O는 기술의 IT가 아니라 개념의 IT에 가깝다. 다만 그 ‘온라인’의 수단이 모바일로 넘어가고, 통신과 센서 기술의 확장으로 ‘어디에서나 온라인’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O2O 시장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게 지금 O2O의 모습이다.
채널의 확대, 가능성의 플랫폼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의 많은 부분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책, 신문, 음악, 쇼핑 등을 하나하나 뿌리부터 흔들어놓고 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부분이 온라인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야 하고,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집을 이사하고, 청소도 해야 한다. 이런 건 온라인이 대신해줄 수 없다. 하지만 온라인이 그 형태를 바꾸는 건 가능하다. 특히 정보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폐쇄적인 환경이라면 더더욱 온라인의 효과는 크다.
[rel]성공한 O2O 사업의 대표는 역시 배달 주문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경쟁도 뜨겁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같은 굵직한 서비스 외에도 계속해서 경쟁자들이 뛰어드는 시장이다. 지역 음식점들의 배달 정보를 모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모아서 음식점에 연결해준다. 그리고 중간에 수수료를 떼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고객을 모아 오프라인으로 연결해준다’는 O2O의 기본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다.
이용자들이야 주변의 숨은 맛집을 확인할 수 있고, 전화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으니 편리하다. 하지만 결국 이 배달 주문 서비스가 영향력을 갖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용자 편의가 중심이 아니라 음식점의 마케팅 플레이스가 된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사업자들에게 가가게의 위치나 광고, 마케팅 등 오프라인의 제약을 떠나 음식의 맛 하나만으로 온라인에서 승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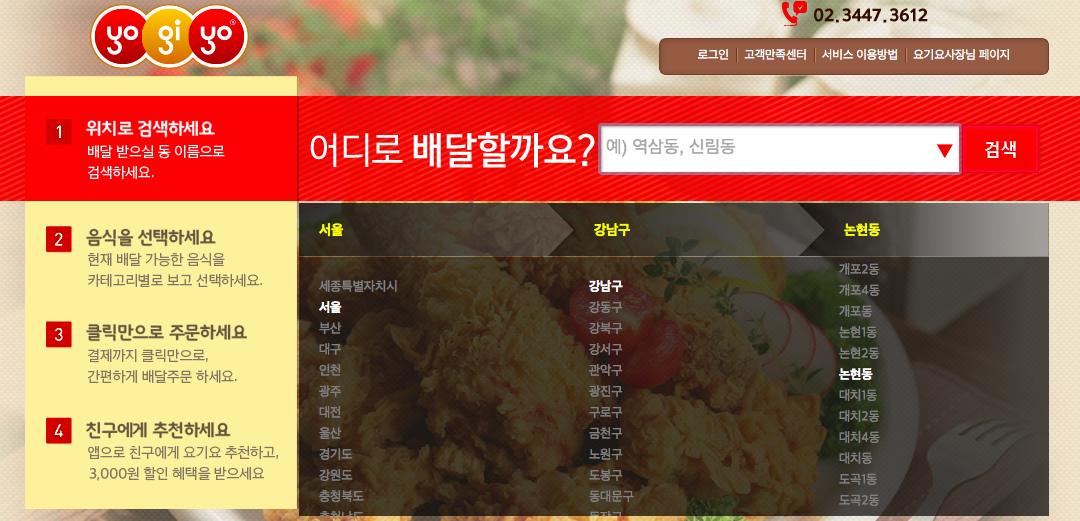
정보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
예를 들면 우버와 카카오택시 같은 차량 서비스가 그렇다. 차량을 예약하는 서비스는 이전에도 있었다. 이른바 ‘콜택시’라고 부르는 택시 전화 예약 서비스다. 이용자는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고, 택시는 콜 서비스를 기다린다. 이 둘을 이어주는 것은 쏠쏠한 사업이었다.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온라인이라면 온라인이긴 하지만) 정보 자체에 지속성이 없다.
이용자가 택시를 부르는 과정은 복잡했다. 말로 설명해야 했고, 언제 올 지 알 수 없이 기다려야 했다. 택시 입장에서도 승객이 할당되는 과정을 알기 어렵다. 한때 택시 안을 시끌시끌하게 했던 HAM(단파통신)의 경우 회사에서 콜을 받으면, 택시들이 ‘저요, 저요’하는 식으로 연결됐다. 지금도 기본적인 시스템은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버는 여기에 온라인을 붙였다. 스마트폰을 들고 서비스에 접속해 차를 부른다. 이용자의 위치는 차량에 전송되고 운전자는 예약자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이용자도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어디쯤 오고 있는지, 몇 분 뒤에 도착할지가 한눈에 보인다.

목적지를 말할 필요도 없다. 우버는 요금 결제도, 운전자와 이야기하지 않는다. 똑같은 이동 수단으로서의 차량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경험은 완전히 다르다. O2O의 핵심은 단순히 오프라인 서비스의 고객을 온라인으로 모은다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얘기다.
O2O의 중요한 정보 중 하나로 ‘서로간의 평가’가 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는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다. 모르는 사람끼리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차량 서비스는 운전자와 승객 사이의 평가가 안전을 답보한다. 부동산 거래 연결의 신뢰도는 말할 것도 없다. 온라인은 단순히 고객 접점을 늘리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경험의 확대로 연결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접근하더라도 일관된 서비스와 경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O2O의 개념보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옴니채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집 청소를 O2O로 만든 홈조이는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다. 음식 배달이나 택시를 연결하듯 청소 서비스 업체를 온라인으로 묶어주는 서비스였다. 기술적인 문제보다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O2O의 특성상 홈조이는 주목을 받았다. 투자까지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지만 문도 빨리 닫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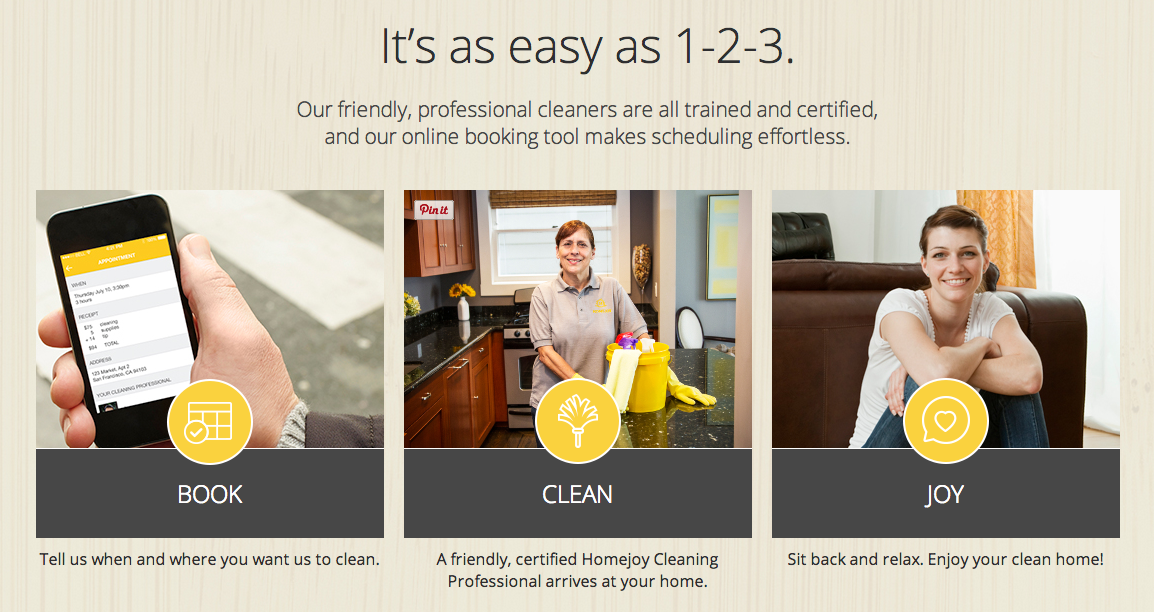
여러가지 이유가 지적됐지만 서비스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수수료가 높았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홈조이 역시 스스로 청소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청소 업체의 서비스를 온라인 채널로 묶어주는 사례다. 결국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인데 이는 공산품이나 음식보다도 더 품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균일한 서비스를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액센츄어와 포레스터리서치는 ‘조사 대상 소비자의 3분의 2 이상이 온라인 상에서 매장의 재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온라인 주문에 대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픽업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실현하고 있는 유통 업체는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발표를 했다.
O2O 사업이 채널을 넓히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 서비스가 잘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고객들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 홈조이의 지적은 배달 주문 서비스들이 겪었던 높은 수수료 문제, 옴니채널은 거치지 않은 것과 다른 서비스, 직거래의 유혹 등과 다르지 않다. 이런 잡음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단순히 접수 창구를 온라인으로 바꾸는 것만이 O2O는 아니라는 것이다.
<덧>
이 O2O라는 단어 자체가 낯선 탓일까. 온라인·오프라인을 일컫는 영어 O(오) 대신 숫자 0(영)을 써서 '020'이라고 표기한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실제로 이렇게 표기한 기사도 적지 않다. ‘오투오’라고 읽는 게 맞다. 하긴, 숫자 020이라고 써도 영어로는 ‘오투오’라고 읽긴 하겠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