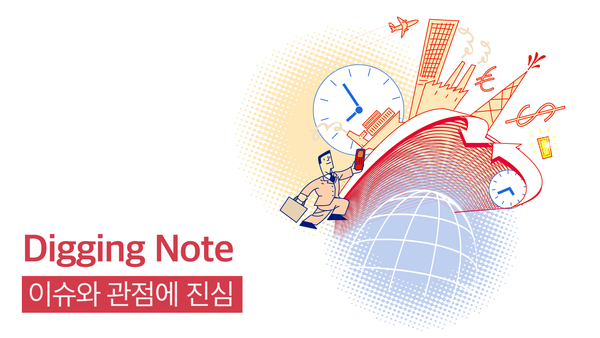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사생활 소식이 전해지던 날 CJ의 주가는 크게 흔들렸다. 하루 만에 2200억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증발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논란이 불거지기 전 20만원 안팎을 오가던 주가는 18만원대 초반으로 곤두박질쳤다.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지난 달에는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의장이 주인공이었다. 그는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바로 그 다음날 카카오 주가 역시 요동쳤다. 하루 만에 시총이 5700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다음날까지 더해 이틀 만에 약 1조4000억원의 기업가치가 사라졌다. 주가는 6만원 선이 무너져 5만원대로 내려앉았다.
반대로 지난 7월 17일 삼성전자 시총은 무려 11조원 이상 불어났다. 이튿날도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며 단 이틀 만에 기업가치가 14조2000억여원 뛰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4년 넘게 이어져 온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였다.
한국 자본시장은 이렇게 기업 총수의 행보에 외줄타기를 벌인다. 흔히 말하는 오너 리스크다. 그룹의 경영권이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다 보니, 개인의 일탈이 곧바로 조직 전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회사의 실적이나 성장 전망보다 더 큰 여파를 남긴다.
문제는 투자자들까지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이다. 예기치 못한 총수 한 사람의 촌극이나 법적 갈등에 개미들은 울고 웃는다. 불안한 회장님의 존재는 이처럼 모두에게 아킬레스건이다.
그리고 이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체다. 이른바 국장에 투자하려면 재무제표가 아닌 오너 일가 가계도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자조적 푸념의 원천이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고에 수많은 주주의 자산가치가 출렁이는 비정상적 시장을 언젠가부터 상수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시정의 신뢰가 없으니 주가는 합리 대신 뜬소문에 휘둘린다. 이성보다 감성 투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설득력을 갖는다. 이런 현실 속 오너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기업들의 구호는 아직 공염불일 뿐이다. 재벌 기업 드라마에 익숙한 우리 사회의 그림자는 여전히 자본시장을 뒤덮고 있다.



